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전면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을 책임자로 지명했다.

|
트럼프의 골든 돔과 부시의 NMD 그리고 한미동맹 |
| 2025년 7월 1일 |
-
전성훈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dr.cheon@sejong.org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골든 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전면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을 책임자로 지명했다. 1)
트럼프는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해서 지구 반대편이나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즉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끝내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는 골든 돔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이 지난 40년간 각종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3,000억 달러를 썼지만 2) 아직도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제한적인 요격시스템을 갖추는 데 머물러 있다. 골든 돔은 트럼프가 제시한 1,750억 달러(약 244조 원)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처는 향후 20년에 걸쳐 5,4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적으로도 본토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4년 안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골든 돔을 자신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고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한계,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4)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골든 돔이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고 그 불똥이 우리 정부로 튈 가능성도 우려된다.
골든 돔은 2001년 부시 대통령의 ‘국가미사일방어망’(National Missile Defense: NMD)을 연상시킨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갓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NMD 정책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외교적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2001년 2월 말 한·러 공동성명에 “ABM 조약의 보존 및 강화”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ABM 조약을 폐기하고 NMD를 구축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5)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해 3월 미국 방문 중 두 차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외교통상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경질되는 사태(장관은 3월 26일, 차관은 4월 2일)를 겪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골든 돔 문제가 한미동맹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안보 정세 급변기에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보 실익을 챙기는 길이다. 이 글에서는 골든 돔에 내재한 기술적 문제와는 별도로, 미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구상이 갖는 동맹 차원의 함의를 살펴보고 NMD 파문과 같은 일이 재발해서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준형, 트럼프 "우주기반 MD '골든돔' 재임 중 가동…레이건 과업 완수"(종합), 연합뉴스, 2025년 5월 21일.
2) W.J. Hennigan, “The reality of Trump’s Colden Dome,” New York Times, May 21, 2025.
3) Max Boot, “Trump should build millions of cheap drones, not Golden Dome,” Washington Post, May 28, 2025.
4) 전성훈,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세종포커스, 2025년 5월 26일.
5)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2월 13일 ABM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U.S. Withdrawal From the ABM Treaty: President Bush’s Remarks and U.S. Diplomatic Notes,” Arms Control Association, January 2001.
| 2001년 봄 NMD 파문
-
문제의 발단은 2001년 2월 말 방한한 푸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2월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의 제5항이다.6)
한국 정부가 NMD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NMD 파문”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ABM 조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는 대북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7) 당시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국무부가 즉각 주미 한국대사관에 항의성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 당시 한나라당의 박관용 의원은 한·러 공동성명 발표 직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다음 3개 항의 비공개 항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9)
-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가
- 다자회의에서 미국과 이견이 있음을 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양자관계에서 미국과 대립되는 측면에 대해 비우호국(러시아)에 동조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 장기적으로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ABM 조약을 지켜나갈 것인가 - 문제가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3월 2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래와 같은 3개 항의 입장을 발표했다.
- 오늘날의 세계 안보상황은 냉전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한다
-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이정빈 장관의 발표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SC 선임보좌관인 패터슨(Torkel Patterson)이 유명환 주미공사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문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10)
오늘날의 세계는 냉전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억지와 방어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는 이런 대응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미국이 이 점에 대해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특히 우리 군과 영토 방위를 위해 효과적인 미사일방어망을 배치할 필요를 인정한다.
외교통상부가 한·러 공동성명의 문구가 NMD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둘러 해명하고 NMD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3월 7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NMD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11)
김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세계안보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제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에 관해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 성명에서 문제가 된 “ABM 조약의 유지·강화”라는 구절은 2000년 5월 제6차 NPT 평가회의와 7월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등 미국이 참여한 다양한 국제적 모임에서 발표된 문서에 나와 있는 문구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NMD에 대한 우리의 반대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2) 러시아 측은 NMD 반대를 표시하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삽입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이 반대했다고 설명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이튿날 미 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최한 오찬에서도 이어졌다. NMD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3)
그런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Regret)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어 NMD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외교통상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러시아 측에서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우리는 거절했다. [한·러 성명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에 관한 문구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2월 말에 불거진 NMD 파문으로 정부 차원에서 모두 네 번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 14) 3월 2일자 외교통상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고 3월 6일 김하중 외교안보수석이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3월 7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과 3월 8일 AEI 오찬 모임에서 김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
2001년 봄 NMD 파문은 막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핵무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미·러 전략경쟁의 실태와 쟁점을 숙지하고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전임 클린턴 정부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였다. 그 결과, 2001년 3월 8일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 맨(this man)’으로 불러 논란이 야기됐고, 이런 기류에 편승해서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김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현격한 정책 차이 인식
한·러 공동성명의 ABM 조약 ‘보존 및 강화’(Preserve and Strengthen) 문구는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과 체결한 협정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ABM 조약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차원의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려는 클린턴 행정부가 러시아의 ABM 유지 입장을 고려해 선택한 타협안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바로 전임 정부에서 등장한 문구이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클린턴과 부시의 현격한 정책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클린턴의 지역 방어망을 뛰어넘어 미국 전체에 방어망을 구축하려던 부시에게 한·러 공동성명은 명백한 도전이자 걸림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바이든-트럼프의 차이는 세계관, 미국의 역할, 국익에 대한 관점 등 모든 면에서 클린턴-부시에 비해서 훨씬 크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성향 역시 바이든과 크게 다르다. 탈냉전 시대의 정책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와 MAGA 지지층의 목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넘지 않으려던 선과 가드레일이 사라졌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대미 외교정책을 짜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지했던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과의 결별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이라는 끈은 유지하되 독자적인 자강력을 키우고 역내 국가들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새 정부는 한미 관계를 규율했던 전통적인 관점과 타성에 안주해서는 않된다. 냉전 종식 이후 우리가 익숙하게 접했던 미국의 통상적인 정책을 기대해서도 않될 것이다.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국제질서와 예상을 뛰어넘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응해서 발상을 전환하고 새로운 사고에 입각해서 국익을 실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골든 돔 구축의 예상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
새 정부가 골든 돔 구상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NMD 파문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골든 돔과 NMD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첫째, 미·중, 미·러의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이를 결단코 저지하려는 중·러 간의 이해가 NMD에 비해 훨씬 첨예하게 충돌할 것이다. 트럼프와 푸틴·시진핑 양측이 전략적 이익은 물론 정치적 명운을 걸고 대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제정세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이 골든 돔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제2의 사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문제인 정부가 중국에 소위 ‘3불 1한’을 약속하면서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15)
셋째,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공조해서 한국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일 것이다. 3국은 골든 돔이 자국의 전략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국의 참여도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골든 돔을 강화된 북·러 동맹을 과시하는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4일 러시아 푸틴의 측근인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심각한 국제정치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골든 돔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대미협상에 대비한 포석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든 돔에 대한 대응은 새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 과제가 될 것이다. 과거 NMD 파문의 교훈과 골든 돔을 둘러싼 첨예한 국제적 갈등, 북한의 예상 행보, 사드 사태의 경험 등을 고려해서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냉전시대인 오늘의 안보상황이 과거 냉전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냉전 당시 안보 문제에서 소련 편을 들 수 없었던 것처럼 현재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정부는 골든 돔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서 한미간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 아울러 골든 돔 구축 과정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16) 골든 돔 참여가 제2의 사드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대중 외교 및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안보문제에 대한 타국의 간섭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병행한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화에 방점을 둔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스타일과 거친 화법은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에서 트럼프가 방점을 둔 부분은 평화다. 트럼프는 자신의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한다. 2기 행정부가 해외 개입을 줄이고 국내 발전을 챙기겠다면서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도 무고한 인명 손실을 막고 쓸데없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이 작용한 것이다. 임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인도·파키스탄 분쟁, 르완다·민주콩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했고, 하마스와의 인질 구출 협상, 후티 반군과의 협상을 진행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17) 트럼프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가자 전쟁을 끝내고 이란 핵시설도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했었다. 18)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후에는 바로 정전 합의를 이끌었다. 트럼프에게는 골든 돔도 중·러를 겨냥한 공격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새 정부는 평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과 인명을 해치는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그의 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골든 돔 구상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수권자인 트럼프의 철학과 신념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지원은 새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미 핵군축 협상에 대비
힘을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협상과 딜을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철학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 핵군축 협상을 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 두고 평화를 달성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경우 미국 여론은 트럼프가 미국의 안전을 지켰다고 평가할 것이다. 북한도 트럼프 2기의 핵군축 제안이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한국 배제 입장과 양자간 딜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핵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 카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한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북·미 협상을 용인하는 대가로 미국의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의 전술핵 능력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술핵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6) 한·러 공동성명 전문, 청와대 보도 자료, 2001년 2월 27일.
7) Patrick Tyler, “South Korea takes Russia’s side in dispute over U.S. missile defense plan,” New York Times, February 28, 2001.
8) 조선일보, 2001년 3월 2일.
9) 중앙일보 , 2001년 3월 14일
10) 한국일보, 2001년 6월 15일.
11) 한미 공동성명 전문, 청와대 보도 자료, 2001년 3월 8일.
12)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Kim Dae-Jung of South Kore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March 7, 2001), p. 5.
13) 중앙일보, 2001년 3월 10일.
14) 조선일보, 2001년 3월 10일.
| 정책적 시사점과 고려사항
15) ‘3불1한’ 약속; ①사드 추가배치 금지, ②미국 미사일방어망 불참, ③한미일 군사동맹 금지, ④사드 운용 제한.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3가지가 넘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22조 4천억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서울에서 500㎞ 정도 떨어진 산둥성 레이더 기지에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조기경보 레이더를 운용중이다.
16) 골든 돔이 초기 구상 단계이므로 아직 우리의 참여 문제가 제기되진 않았다. 그러나 세계미사일방어망 구축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동북아의 지정학 요충지인 한국은 참여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이미 주한 미군 우주군이 2022년 12월 14일 오산에 창설되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골든 돔 구상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日, 트럼프의 '골든돔'에 협력 검토.. 관세협상의 카드로도 활용,” 조선일보, 2025년 6월 6일.
17) David Ignatius, “Trump the improviser has a head-spinning diplomatic week,” Washington Post, May 13, 2025.
18) "Trump to Netanyahu: 'The war is exhausting itself - finish it' - report," Jerusalem Post, June 10, 2025. 트럼프는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핵협상 전망이 어두워지자 6월 22일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했다.
19) 전성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세종포커스, 2024년 11월 7일.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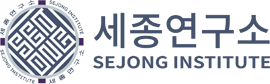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