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과 더불어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다.

|
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
| 2025년 9월 25일 |
-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jungsupkim@sejong.org
-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다.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세율 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관세 문제는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동맹 현대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동맹 현대화는 관세 및 투자 문제 못지않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조정 등 동맹 현대화의 세부 쟁점들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논의만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세부 사안들은 앞으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강조되고,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주둔 규모 및 전력 구성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목적은 일관되게 북한 위협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 세력의 일원인 북한을 억제하는 일이 곧 소련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었으며, 소련 붕괴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군사 자산으로 기능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이 일방적 안보 수혜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유사시엔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상호방위조약의 규정과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가장 큰 효용은 ‘보호’가 아니라 ‘기지 접근권’이었다. 한반도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가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면서 북한 위협은 점차 부차적 문제로 격하되고, 미국의 군사 자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동맹의 근간인 위협인식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맹의 역할과 목적을 둘러싼 전략적 공감대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방식대로 동맹 현대화가 추진된다면,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한미 지휘체제 전반에 큰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동맹 변화의 양상과 폭을 두고 다양한 전망과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의 경우 수천 명 수준의 소폭 조정에서부터 철수에 준하는 수만 명 감축안까지 거론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 연계 이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와 정책 이슈들이 단순 열거되는 데 그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다양한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중국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큰 흐름은 분명하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과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태세 조정, 확장억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상이한 전망과 주장은 이러한 다양한 전략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 견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 목표의 수준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태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대만해협을 미국의 사활적 지역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를 제2도련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큰 틀의 대중국 전략 기조가 한미동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워싱턴 내 다양한 전략적 시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국 우선 진영의 ‘동맹 조정론’, 전략적 후퇴론의 ‘동맹 축소론’, 그리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맹 확장론’이다. 트럼프의 등장을 계기로 미국 대외전략 기조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크게는 중국 우선주의자(prioritizers), 개입 축소주의자(restrainers), 미국 우위론자(primacist)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를 한미동맹에 대입해 보면, 중국 우선론은 동맹 조정, 개입 축소론은 동맹 축소, 미국 우위론은 동맹 확장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워싱턴의 전략적 관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한국의 향후 대응 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동맹 현대화를 견인하는 대표적 논리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최우선론’이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 견제가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적 관심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1)
2025년 4월 보도된 미 국방부의 ‘잠정 국방전략지침’ 역시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면서, 러시아·북한·이란 등 기타 지역 위협은 동맹국들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에 더 많은 재정적·군사적 부담을 요구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 견제, 특히 대만해협 분쟁 대비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태세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 우선론은 탈냉전 이후 미국 주류 외교가 지향해온 글로벌 차원의 자유주의 패권 외교를 비판하며, 중동과 유럽에서의 관여를 줄이고자 한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더 이상 두 개 전장을 동시에 감당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과, 중동과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사활적 이익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2) 실제로 2025년 2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은 나토 연설에서 “엄혹한 전략 현실 때문에 미국이 유럽 안보에 주력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역사적·문화적 유대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중시해 온 전통적 입장과는 크게 다른 기조다. 또한 콜비를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우선론은 기존 인·태와 나토의 연결 전략에도 회의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유럽의 인·태 지역 내 군사적 존재감 과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나토 간 연대 심화가 강조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는 미국이 인·태와 유럽에 자원을 분산하며 유사시 나토의 기여를 기대하기보다는 유럽 방위는 유럽에 맞기고 미국은 아시아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 즉, 러시아 위협은 유럽이 일차적으로 감당하고, 중국 위협은 미국이 인·태 동맹국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역할 분담론’이다.
중국 견제 우선론은 전통적 패권 외교를 비판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는 후퇴를 거부하는 매파적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대만해협을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역 헤게모니 판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한다.3) 대만이 중국에 강압적으로 흡수될 경우 미국의 역내 입지는 급속히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반중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호주·일본·필리핀 등이 주요 파트너로 지목된다. 한미동맹 역시 이러한 인·태 전략의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 관점에서 동맹은 여전히 미국의 주요 자산이지만, 그 성격과 역할은 중국 견제에 기여하는 한에서 철저히 수단적 지위로 격하된다.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지로 이전할 수 있다는 보도나,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에 국한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역내 위기 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중국 견제 우선론의 전략적 시각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일정 부분 감축될 수 있으며, 한반도 역외 작전을 고려한 병력 조합 변경과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과 동맹의 현상 유지는 배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방부가 구상하는 이러한 전략 기조가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동맹 현대화가 처음 거론되었을 때는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한미 지휘 구조 개편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마무리 작업 중인 ‘국방전략서(NDS)’ 초안을 접한 인사들에 따르면,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Homeland Defense)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남부 국경 관리,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 대응 강화, 그리고 ‘골든 돔’ 시스템을 통한 미사일·우주 위협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단속 지원에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카리브해 지역에 다수의 전투기와 군함을 전개한 바 있다.
따라서 본토 방어가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중국 견제에 군사력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견인하는 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큰 틀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 진영’이지만, 중국 견제보다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더 중점을 두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설령 국방전략서에서 중국 견제가 중요하게 기술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는 또 다른 문제다. 특히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대중국 전략을 둘러싼 균열이 존재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의 성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 전략에 동조화하려는 구상이 실제로 정책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해외 주둔 미군 태세 조정과 관련해 가장 급진적인 제안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선임 고민을 지낸 댄 콜드웰(Dan Caldwell)과 워싱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Defense Priority)의 제니퍼 캐버너(Jennifer Kavanagh) 선임연구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2025년 7월 9일 공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현재 약 2만 8천 명 규모를 약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5)
구체적으로는 기지 방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순환 배치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여단을 포함한 제2보병사단 대부분), 2개 전투비행 대대,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 인력 등이 철수 대상에 포함된다. 남겨지는 미군 정비 및 지원 인력 역시, 주한미군 기지가 역내 분쟁 시 수송과 정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정된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존재를 철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콜비 차관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론 진영보다 더 급격한 제안이 나오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역외 활용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의 주력인 지상군은 애초에 한반도 외 작전에 적합하지 않고, 오산과 군산 기지의 미 공군조차 대만해협까지의 작전반경이 너무 넓어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 육군이 장거리 정밀타격, 전자전, 사이버전 등 복합적 능력을 갖춘 ‘다영역 임무군(MDTFs)’을 창설해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이는 육군 조직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다. 결국 인·태 지역 해상에서 발생할 미·중 충돌에서 미 육군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일부 감축이나 전력 배합의 변경으로는 부족하며, 전면적 태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전략적 후퇴론자들은 중국 견제 매파들과는 다른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한다. 중국 견제 우선론자들이 대만해협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는 반면, 이들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가 아니라 미·중 간 적절한 세력균형을 추구한다.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더라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입지에 치명적 손상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대만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6) 일본, 호주, 아세안, 한국 등 중국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역내 강국들이 존재하고, 동아시아가 육지가 아니라 해양환경이라는 작전적 조건을 고려할 때 중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완전히 장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근거다. 7) 따라서 이들 후퇴론자들은 “대만이 미국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로 사활적 가치는 없다(Taiwan certainly matters to the United States―just not enough to justify a war with China)”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들은 현행 미군의 전진 배치를 문제 삼는다. 중국 연안에 지나치게 가까운 미군 기지는 생존성이 취약해, 충돌을 염두에 두더라도 군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물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주일미군도 동쪽과 제2도련선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2개 비행단을 미사와나 요코타 기지로 이전하고, 수천 명의 해병대를 괌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오키나와 주둔 미군 약 14,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낮추되, 필리핀해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필리핀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면 미국의 아시아 시장 접근과 미·중 간 최소한의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면 재조정은 한미동맹의 이완과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고조시키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전략적 후퇴론자들도 인식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교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즉, 동맹국의 우호적 핵무장은 해외 주둔 미군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고, 오히려 동맹국의 자립과 자강을 유도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여기엔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사활적 이익이 아닌 지역분쟁에 미국이 핵전쟁 위험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면적 재조정론은 기존 미국 대외전략과도 결이 다르고, 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비교해도 주류적 견해는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철수에 가까운 주한미군 재조정이나 전면적 인·태 지역 미군 재배치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해외 개입에 대한 미국민의 피로감과 고립주의 성향 확산을 감안하면, 이런 소수 의견이 향후 미국의 안보 전략 논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을 형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
중국 견제 우선론과 전면적 재조정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주한미군의 축소 조정을 제안한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해협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 혹은 인도·태평양 전반의 미군 태세를 제2도련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중국을 염두에 둔 인·태 전략 속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작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관점은 북한 위협 대응과 중국 견제를 별개의 임무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문제로 보며, 한반도의 군사적 자산이 대만해협 분쟁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8)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한반도의 미군 기지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작전적·군수지원 허브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내 분쟁 발생 시 미국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현상 유지뿐 아니라 증강 가능성도 열린 셈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4일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Samuel Paparo)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언의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전직 태평양 육군사령관 역시 최근 한국 전문가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능력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을 넘어, 상시 배치와 순환 배치가 융합된 ‘역동 전력(dynamic force)’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전자전·사이버전·무인 전력 등 능력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주한미군은 사실상 극동사령부로 발전해 동북아 전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역내 분쟁 시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작전적 가치 때문이다. 대만해협 분쟁 시 제2도련선이나 미 본토에서 전력을 투사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작전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만해협과 미 서부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 간 거리는 1만 km가 넘고, 괌과의 거리도 3천 km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태평양 전역에서 완전한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미 분쟁 지역화된 구역까지 전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면 한반도는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유한 것처럼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위치한 항공모함”으로서, 역내 작전에 결정적 기여가 가능하다. 특히 한반도는 탄약과 전쟁 물자의 비축, 수송·정비 등 군수지원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시각은 또한 북한 위협과 대만해협 분쟁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한반도 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한에 대한 전면 공격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만해협 위기 시 중국과 모종의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은 대만해협 안정과 분리된 과제가 아니며,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역량 강화는 곧 대만 안보에 기여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대만 위기 시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한국이 연루의 위험을 우려해 대만 문제에서 거리를 두려 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중시론자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규정과 정신이 일방적 보호가 아닌 상호 원조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 9) 이들은 또한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현실화된 개념으로 본다. 중동 분쟁 시 주한미군의 보병, 항공, 방공 전력이 여러 차례 순환 배치된 것처럼, 향후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평시 한미 간 합의와 무관하게 미국은 주한미군을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
동맹 현대화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감축될지, 감축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하며, 반대로 감축 없이 현상 유지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워싱턴 내부에는 동맹 현대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전략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 차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 현대화는 단순히 한반도 차원에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미군 태세 조정의 큰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현재 작성이 막바지에 이른 미 국방전략서(NDS)는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보다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미국 국방전략의 기조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워싱턴의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콜비 차관의 행정부 내 역할은 다소 과장되어 있으며, 오히려 루비오 국무장관의 역할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동맹을 중시하는 루비오 장관의 신념을 고려한다면, 동맹 현대화로 인한 변화 폭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내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할 NSC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하며, 부처와 그룹 간 권력 구도에 따라 정책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관점과 의사결정 방식도 안정적 정책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는 분명히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 외교와는 뚜렷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세 협상과 국내 제조업 부활에 집중하며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 결속에는 관심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외교가 ‘마가(MAGA)’ 세력이 기대하는 만큼 고립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다. 그는 금기시되던 이란 폭격을 단행해 지지층을 놀라게 했고, 유럽에서도 나토 탈퇴나 관여의 급격 축소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중국 정책에서도 무역을 제외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략가들보다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최종 의사결정은 정책을 조율하는 공식적 프로세스가 부재한 가운데 그때그때 트럼프의 귀를 잡는 인사의 영향력과 그의 협상가적 직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이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두드러진 상황이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지만, 동맹 현대화 이슈를 접근함에 있어 저변에 깔린 전략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더라도, 변화의 기준과 방향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증·감축, 전략적 유연성, 한미 지휘체계 변화, 확장억제 문제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면 체계적 이해와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어렵다.
현재로서는 동맹 조정론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역할 변화에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강 차원에서 한반도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 연료 농축 및 재처리 역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내 복잡한 권력 역학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동맹이 큰 변화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동맹 확장론은 동맹의 결속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미·중 분쟁에 빨려 들어가는 ‘연루의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담론이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평시부터 한중 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A2AD 역량 고도화가 이어진다면, 한반도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도 의문이다. 동맹 축소론은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인·태 지역 미군 태세의 전반적 재조정에 담긴 군사적 합리성과는 별개로, 중국의 세력권 확장을 인정하며 미국이 후퇴한다는 정치적·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축소는 일본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 일본이 변심할 경우 미국이 사실상 대륙 국가로 축소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미·중 군사력 균형이 변화하고 미국 내 고립주의 경향이 강화된다면, 이 논의가 비주류 담론에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기조 속에서 제기된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혼선과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미국의 전략 사고 저변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과 능동적 동맹 재설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서론
| 중국 우선 진영의 동맹 조정론
1) Elbridge A Colby, 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1.
2)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s, “Strategies of Prioritization: American Foreign Policy After Primac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25.
3) Gideon Rachman, “Why Taiwan Matters to the World”, Financial Times, April 10, 2023. 대만의 지정학적, 상업적,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대해서는 Luke P. Bellocchi, “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aiwan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Part One”, The US Army War College Quarterly: Parameters, vol. 53, no. 2, 2023.
4) James Palmer, “The Pentagon Fixates on War Over Taiwan”, Foreign Policy, May 6, 2025.
| 전략적 후퇴(pivot home) 진영의 동맹 축소론
5) Jennifer Kavanagh and Dan Caldwell, “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 Defense Priority, July 9, 2025. https://www.defensepriorities.org/explainers/aligning-global-military-posture-with-us-interests/
6) Charles L. Glaser, “Washington Is Avoiding the Tough Questions on Taiwan and China”, Foreign Affairs, April 28, 2021.
7) Jennifer Kavanagh and Stephen Wertheim, “The Taiwan Fixation: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nable War”,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5.
|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입각한 동맹 확장론
8) Brian Kerg, “South Korea is the ideal anchor for the first island chain”, Atlantic Council, July 10, 2025.
9) Markus Garlauskas,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is outdated: A new age requires a ‘titanium’ alliance”, Atlantic Council, June 24, 2025.
| 전망과 대응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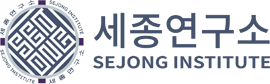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