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7일 행정명령(EO 14186)을 통해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
골든 돔 실현을 위한 민군 융합형 우주방위체계 설계: 상업 위성과 군사 위성의 통합이 갖는 전략적 함의 |
| 2025년 10월 20일 |
-
주광섭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myjohj1@naver.com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7일 행정명령(EO 14186)을 통해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5월 20일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체를 포함하는 아키텍처를 발표하며 이 구상을 구체화했다.1)
이 구상은 1980년대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SDI),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NMD)에 이은 미국식 절대안보(absolute security) 프로젝트의 최신판이라 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번에는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가 전장의 중심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골든 돔은 단순한 미사일방어망이 아니라 ‘우주기반 통합억제체계(Space-Based Integrated Deterrence System)’의 성격을 가진다.
한미는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며 확장억제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했다. 3) 4) 미국은 본토 방어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동시에, 역외 억제에서는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협력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골든 돔은 이러한 전환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억제 인프라이자 우주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번 구상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 우주산업과의 결합이다. 미국은 재정 압박 속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성망(Starlink, Maxar, Planet Labs 등)을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적극 통합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군사위성 중심의 폐쇄형 체계에서 벗어나, “상업 위성과 군사자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민군융합형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사일 요격체의 성능과 더불어 데이터 통합·처리·복원력(resilience)이 상호보완적으로 국가방위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의 혁신이 곧 미국의 안보”라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민군융합형 우주방위체계(Commercial–Defense Integrated Space Architecture)의 방향성5) 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RAND 연구소의 2025년 3월 보고서, Opera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ntegrating Commercial Space Services into DoD Operations에서 구체적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상업 위성·민간 데이터의 군사 통합은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Data Trust Framework)’, 보험·책임·사이버/물리 방호 등 법·제도 과제를 동반한다. 이는 곧 데이터 중심 억제 생태계(data-centric deterrence ecosystem)로의 전환이라는 본 연구의 전제와 직결된다.6)
결국 골든 돔은 “미국의 본토방위망”을 넘어 우주·AI·데이터·동맹을 결합한 새로운 억제 패러다임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 속에서 특히 민간 위성과 군사 위성의 통합이 억제체계의 실효성에 어떤 전략적 함의를 갖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변화 속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Golden Dome)’ 구상은 전통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넘어 지상–해상–우주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민군 융합형 방위 아키텍처’로 설계되고 있다. 이 체계는 요격체나 무기 플랫폼의 단순한 성능개량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처리–결심–대응이 실시간으로 순환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억제와 전장지휘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골든 돔은 다음과 같은 3중 계층 구조(Three-Layer Network)를 기본으로 한다.7)
1. 1계층 : 민간 데이터망 (Commercial Constellations Layer)
가장 하위층은 Starlink, OneWeb, Amazon Kuiper 등 민간 위성망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천 기의 소형 저궤도(LEO) 위성으로 이루어진 대용량 통신·이미지 전송 인프라를 제공한다. 군사정찰위성보다 궤도 재방문 주기가 빠르고, AI를 활용한 자동 영상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확장형 ISR(Inform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플랫폼”으로 활용하려 한다.
민간 위성망은 각국의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며, 군사작전의 초기 탐지·경보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Starlink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실증된 바와 같이, 적의 전파교란 하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하고 지휘통제(C2) 지속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골든 돔은 이러한 민간망을 ‘1차 탐지–통신–전장 인식(Situational Awareness)’ 계층으로 편입하여 민간 데이터를 군사 데이터로 전환하는 이중 인프라(Dual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층에서 수집된 영상·통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군사 위성망과 지상통제소로 전송되어, ‘AI 융합플랫폼’이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 즉, 민간망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우주 기반 억제체계의 전방 감지 레이어로서 작동하게 된다.
2. 2계층 : 군사 우주자산 (Defense Space Assets Layer)
중간층은 미 국방부 산하 주개발국(SDA: Space Development Agency)이 주도하는 군사 위성망과 정찰·조기경보 위성(Overhead Persistent Infrared: OPIR),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지역 우주전대(Osan Space Squadron) 등으로 구성된다.이 계층은 골든 돔의 핵심 작전영역으로, 실질적 요격과 방어 기능을 수행한다.
SDA는 현재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PWSA)”라는 이름으로 약 1,000기 이상의 중·저궤도 위성망을 구축 중이다. 이 위성들은 감시·정찰·표적획득·데이터 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전장정보를 즉시 공유한다.
특히 골든 돔 체계에서는 ① 발사 초기단계 탐지(Early Launch Detection), ② 위협 궤적 추적(Trajectory Tracking), ③ 요격자산 유도(Guidance and Fire Control) 기능이 모두 이 군사위성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계층은 AI 기반 자동 판단 체계(AI-aided decision support)를 통해 수 초 내에 공격–방어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는 인간의 개입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극초음속 무기(HGV)에 대한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한미군의 오산 우주작전전대는 이와 같은 다층 네트워크의 지역 노드(node)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한반도 상공의 정찰·감시 자산을 골든 돔의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동해 한미동맹 차원의 우주정보 공유체계(space ISR sharing)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장차 한국이 참여 가능한 ‘한미 확장억제 우주연동체계(Extended Deterrence Space Link)’의 기반이 될 수 있다.
3. 3계층 : AI 기반 융합플랫폼 (AI-Driven Fusion & C2 Layer)
상위층은 AI 기반 데이터 융합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민간·군사 위성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전장 전반의 상황을 예측·분석·결심하는 ‘두뇌(brain)’ 역할을 수행한다.
AI 알고리즘은 다중 센서(satellite, radar, infrared, electronic signal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센서 융합(Sensor Fusion) 기술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고, 이상값(anomaly)을 탐지하며,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선별해 작전지휘망으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탐지–판단–대응의 전 과정을 수초 단위로 단축시켜 기존의 인간 중심 의사결정보다 5~10배 이상 빠른 자동 억제–요격 루프(Auto-Deterrence Loop)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융합플랫폼은 단순히 기술적 지휘통제체계(C2)를 넘어 전략적 억제의 메타플랫폼(meta-platform)으로 기능한다. 즉, 실시간 데이터의 흐름 속도와 복원력(resilience)이 곧 억제력(deterrence power)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AI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공격 시 백업 경로를 자동 활성화하며,사이버 공격·전파교란·위성 파괴 시에도 작전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RAND가 강조한 “Resilience by Design(사전 내재형 복원능력)”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4. 통합 네트워크의 전략적 의미
이와 같은 3계층 구조는 “무기 중심의 방위체계에서 데이터 중심의 억제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즉, 미사일 요격기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품질, 전송속도, 복원력이다. 골든 돔은 데이터를 신속히 모으고, 판단하고, 공유하는 능력 자체를 ‘전력(force)’으로 간주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구조는 또한 동맹국과의 협력에도 새로운 형태의 상호의존성을 만들어낸다. 민간 위성망의 군사적 활용은 상업적 이익과 국가 안보 목적의 충돌 및 공격 대상화(targetable entity)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동맹 간 법적 명확성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Data Trust Framework)'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의 신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K-방공체계(KAMD), 한국형 위성감시망, LIG넥스원의 MUM-T(유무인 복합전) 기술 등과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
결국 골든 돔은 우주억제의 산업화 모델이자 동맹의 데이터 동맹화(Data Alliance)를 촉진하는 구조이다. 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작전 정보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억제력의 화폐(currency of deterrence)로 기능하게 된다. -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 구상은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양국은 2025년 5월 8일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우주기반 미사일방어망이 “전략공격무기와 전략방어무기 간의 불가분 원칙을 파괴하고, 세계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9) 두 나라는 골든 돔을 미국의 “전략적 절대안보(Strategic Absolute Security)” 추구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1. 중·러의 예상 대응 시나리오
최근 중·러는 우주·전자·사이버 영역의 협력 강도를 높이며, 미국의 골든 돔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층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우주 군사화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지만, 기술적·운용적 측면에서는 합동 위성망 구축, 우주–전자전 연동(Integrated EW–ISR Operations), 사이버·정보전 결합 등의 방향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합동 위성망 구축(Joint Satellite Constellation)
중국과 러시아는 2025년 6월 이후 ‘합동 위성망’ 구축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의 Sfera Project(2024~2030)와 중국의 Guowang(GW) 위성망(총 12,992기 계획)이 상호 연동되어, 실시간 감시·데이터 릴레이·통신 백업 기능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이 통합망은 골든 돔이 작동할 경우를 대비한 ‘반(反)골든 돔용 대체 우주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으며, ASAT(위성요격), 레이저 교란, 전자정찰(ELINT) 자산의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공동 감시·공격망의 기반이 된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Guowang 위성망은 Starlink와 유사한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저궤도(LEO) 다중 연결망을 통해 러시아 극지방까지 커버하도록 확장되고 있다. 이로써 중·러는 위성 상호 보완을 통해 전시(戰時)에도 데이터 중복성과 통신 생존성(resiliency)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우주–전자전 연계 강화(Networked Electronic–Electromagnetic Warfare, NEEW 가능성)
중·러는 위성망 통합과 병행해 네트워크전자전(Networked Electronic–Electromagnetic Warfare: NEEW)을 핵심 대응축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Krasukha-4, Tirada-2S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위성·지상통신 교란 능력을 강화했고, 중국은 Hongyun-1, Shenlong EW Satellite를 투입해 우주–지상 간 전자전 통합(Integrated EW–ISR Operations)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
이 체계는 미국과 동맹의 위성망을 향해 전파방해, 데이터 혼선 유도, 신호 위조(spoofing)를 수행함으로써 탐지·추적·요격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러시아는 Peresvet 계열 레이저 요격체계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중국은 Shenlong-II 플랫폼을 활용한 ASAT(위성요격) 관련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골든 돔의 상층 탐지·통신망(OPIR·중계위성)을 잠재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축적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무대로 한 ‘회색지대 전략(gray-zone strategy)’의 구체화로 해석된다.
(3) 회색지대 전략과 다영역 확산
중·러는 위성·전자·사이버 영역을 결합한 ‘다층적 비대칭 대응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군사 충돌의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서, 미국의 우주망을 동시 교란–부분 마비–정보 분절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전략은 곧 ‘선택적 교란(selective disruption)’과 ‘지속적 압박(continuous coercion)’의 결합으로, 골든 돔의 탐지–추적–통제 루프를 단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 전략적 안정성의 제도적 균열
이 같은 대응은 전략적 안정성의 제도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2024), 미국과의 New START 협정 만료 예고(2026), 중국의 핵탄두 증강 및 신형 MIRV(ICBM 다탄두 재배치)는 군비통제(arms control) 체제의 ‘사실상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10) 골든 돔은 이러한 군비통제 균열의 촉매로 작용한다. 미국이 “완전한 본토 방어”를 추구할수록, 중·러는 불확실성의 전략(Strategy of Instability)을 강화하며 핵·우주·사이버 영역의 다차원 경쟁(multi-domain race)으로 확전시킨다.
결국 이는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의 전형으로, 상층의 핵 안정성이 확보될수록 하층(비핵·비대칭) 영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구조를 현실화시킨다.11) 이미 러시아의 GNSS·GPS 교란, 중국의 전자정찰 강화, 러시아 극지방 및 남중국해 지역의 위성 데이터 재전송 차단 등은 그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연속성(Data Continuity) 확보가 우주억제체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3.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과 한국의 역할
이러한 불안정 구조는 한반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미국의 MD 강화와 골든 돔 추진을 ‘자위권 침해’로 규정하며 핵·미사일 시험 및 사이버·전자전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중·러는 이를 명분으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오산 우주작전전대를 통해 골든 돔 네트워크의 부분적 연동(partial linkage)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는 확장억제 강화와 동시에 중·러의 표적화(targeting) 위험을 함께 수반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위기로 보지 말고, ① 데이터 복원력(resilience) 중심의 내부균형, ② 법적 제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보호 체계 구축, ③ 한미 공동 설계자로서의 역할 확대라는 세 축을 통해 “위기를 체질 개선의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 ①·③의 논지는 전성훈, 「트럼프의 골든 돔과 부시의 NMD 그리고 한미동맹」, 12) -
골든 돔의 가동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계와 한국의 전략 환경 모두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이 본토 중심의 방어에 집중하고 동맹국에 역외 억제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확장억제, 특히 통합억제와 그 일부로서 재래식-핵 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에 주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통합억제의 실효성은 우주자산과 이를 연결하는 지상 통신·통제망(위성통제소, 데이터센터, 사용자 단말 등)에 대한 사이버 및 AI 기반 공격 대비와 복원력 확보를 전제로 한다. 우주체계는 궤도상의 위성만큼이나 지상 인프라의 생존성에 의존하며, 지상 네트워크가 교란될 경우 전체 억제체계의 작동이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Resilience by Design(사전 내재형 복원능력)’ 개념은 우주 영역을 넘어 지상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지상 네트워크 보호는 곧 우주방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민간 위성 데이터의 군사 활용과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안보법(가칭)’을 제정하고, 상업 위성망이 공격받을 경우의 법적 대응·보험·보호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규제가 아니라, 확장억제의 국내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이는 기존 「우주개발진흥법」(2008)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 등과 달리 세 가지 점((민군 융합 명시, 데이터 주권 규정, 보호·보험 체계)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 법은 일본의 「우주안전보장법(2023)」, 미국의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2015)」와 달리 ‘데이터 신뢰(Data Trust)’와 ‘사이버 방호’를 국가 차원에서 명문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기술·산업 측면에서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다.
국내 방위산업과 민간 우주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AI 기반 국방 데이터 허브(Defense Data Hub)를 구축해 미국 내 예산 및 실현 가능성 논란을 보완하고 GD의 복원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우주 AI, 데이터 신뢰 인프라, 민관 융합 ISR 자산을 바탕으로 미국의 우주C2망과 연동 가능한 데이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한국의 우주산업을 단순 하청 구조에서 공동 운용·공동 개발의 ‘데이터 동맹(Data Alliance)’ 구조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동맹 차원의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체계 하에 ‘Space Deterrence Working Group(우주억제 실무그룹)’을 신설하여 우주정보 공유, 상업 위성 보호, 민군 데이터 융합 정책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실무그룹은 핵협의그룹(NCG)과 정책적으로 연동(coordinated)되는 형태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확장억제의 피보호국’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co-designer)’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넷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균형 외교가 병행되어야 한다.
골든 돔 참여를 대중국 견제나 군사 블록 확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통한 방위 효율성 제고”라는 명확한 프레임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외교적 장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우주억제체계의 자율성 확보가 장기적으로 필수적이다.
AI, 위성통신, 레이더, 전자전 등 핵심기술을 자체 축적하여 한미동맹의 하위체계가 아니라 자율적 협력 파트너로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가우주안보법 제정과 민군 데이터 허브 구축 등 제도·인프라 기반을 확립하고, 중기적으로는 AI 기반 우주 C2 플랫폼과 상호운용성 실증을 통해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자 위성항법·정찰체계 구축을 완성해 ‘K-Space Deterrence 2035’로 대표되는 자율적 억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동맹 내 기술 종속을 최소화하고, 골든 돔과 같은 글로벌 억제체계 속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보장하는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다.
요컨대, 한국은 골든 돔 시대를 단순히 “동맹의 변수”가 아니라 우주방위 혁신과 민군융합산업 도약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데이터 동맹의 핵심 축이자, 동북아 전략 균형의 조정자”로서 한국의 역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Golden Dome)’은 단순한 미사일방어망이 아니라, 우주·AI·민간 데이터가 결합된 통합 억제체계의 출현을 상징한다. 이는 냉전기의 ‘무기 경쟁’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네트워크 경쟁으로 진화한 21세기형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다.
그러나 미국의 절대안보 구상은 중·러의 대응을 촉발하며 핵·우주·사이버 영역의 전략적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동맹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① 상업·군사 데이터를 연결하는 민군 융합형 우주방위 인프라,
② GD의 개념·정책적 공백 단계를 활용하여 한국이 타 동맹보다 먼저 연합 C2, ISR·AI 공유/신뢰 네트워크 등 표준 모델 설계 및 실증사업에 중심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미래 우주 안보 환경의 공동 설계자 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표준 주도권 확보,
③ 장기적으로 자율적 억제 역량과 기술 독립성 확보라는 세 축을 병행해야 한다.
골든 돔의 시대는 더 이상 ‘방어’만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데이터를 통제하고 해석하며 보호하는 능력, 즉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이 곧 국가 억제력의 새로운 척도다.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데이터 동맹의 핵심 축이자, 동북아 전략 균형의 조정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 안보의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다.
| 서언: 트럼프 2기의 ‘골든 돔’과 우주전의 현실화
1) The White House. (2025, 5월 20일). The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https://www.whitehouse.gov/videos/the-golden-dome-missile-defense-shield/1
2) 전성훈. 「트럼프의 골든 돔과 부시의 NMD 그리고 한미동맹」. 세종포커스, 2025-07-01.
3) The White House. Washington Declaration. 2023-04-26.
4) U.S. Department of Defense. Readout of the Inaugural U.S.–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2023-07-18.
5) 전성훈.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세종포커스, 2025-05-26.
6) RAND Corporation. Opera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ntegrating Commercial Space Services into U.S. Department of Defense Operations (RRA2562-2). 2025-03-04.
| 골든 돔 구상의 민군 융합형 구조
7) RAND Corporation. Opera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ntegrating Commercial Space Services into U.S. Department of Defense Operations (RRA2562-2). 2025-03-04.
8)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 중·러의 반발과 전략적 안정성의 위기
9) The Kremlin, “Joint Statement by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Global Strategic Stability,” 2025-05-08.
10) 이상현·피터 워드, 「제3차 핵시대에서의 전략적 안정성」, 세종포커스, 2025-06-09.
11) RAND Corporation, Opera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ntegrating Commercial Space Services into DoD Operations (RRA2562-2), 2025-03-04.
12) 세종포커스, 2025-07-01.의 견해를 인용·참조함.
|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 맺으며 : 데이터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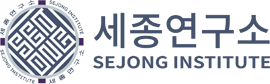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