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극적인 만남은 결과적으로 없었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러브콜’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답하지 않았다.

|
‘판문점딜 2025’ 불발과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구상 |
| 2025년 11월 5일 |
-
하태원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taedee99@gmail.com
-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극적인 만남은 결과적으로 없었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러브콜’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답하지 않았다. 체제의 숙원인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듯한 발언을 연달아 내놨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북 제재의 완화를 시사하는 태도도 보였지만 4번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북 정상의 회동 불발은 단순히 기술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김정은의 깜짝 만남을 그동안 중단되어 온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중물로 삼으려 했던 이재명 정부의 구상도 일정 정도 궤도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1기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2019년 6월의 판문점 회동과 이번 만남 불발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6년 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이번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를 워싱턴의 의도와 평양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 뒤, 향후 미-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려 한다.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미지수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더 집중하고 있는 북-중-러 3각 협력의 강화 역시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는 커다란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
2019년 6월의 판문점 회동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의 방한 계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만남 제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6년 전에 트위터(현재 X)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즉흥성’에서 만큼은 판박이였다.
격식을 갖추지 않고 툭 던지듯 발신한 메시지라는 점도 유사성이다. 다만 제안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 비중은 달랐다. 2019년 트위터가 ‘판문점에서 그저 손잡고 인사나 한 번 하자’는 정도의 가벼운 제안이었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북-미 협상의 전제조건을 거론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러브콜’이었다.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1) 라고 한 뒤,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2) 고 말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트럼프의 집요함이다. 한 차례 트위터를 날렸던 2019년과 달리 아시아 순방을 위해 미국→말레이시아→일본→한국으로 이동하는 도중 빠짐없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심지어 1박 2일로 정해진 한국 방문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가 하면, ‘그 곳(there)’에 갈 수 있다는 말도 했다.3) 여차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DMZ 북측 ‘판문각’은 물론 북한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자신의 방한에 맞춘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해온 일이고, 또 하나를 발사한 것”이라고 했다.4)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메시지 발신과 추진 과정에는 그나마 유사점이 있었지만, 결과는 180도 달랐다. 2019년 제안에 북한이 반응한 시간은 불과 5시간 만이었고, 김정은이 판문점으로 걸어 나온 것으로 치면 하루 반나절 뒤인 32시간 안에 이뤄졌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만남이 성사됐지만, 이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로 회동 무산을 공식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에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는 “내가 너무 바빠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는 말로 향후 미-북 정상 간 직접 대화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에 진심이다. 임기 첫해부터 지구촌 곳곳의 분쟁 해결에 자신의 영향력과 미국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정전을 끌어냈고,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을 주재했다. 이밖에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인디아 △이집트-에티오피아 간 국경분쟁 및 무력충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고 자부한다.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도 관여하고 있다. 10월 12일에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Trump Declaration for Enduring Peace and Prosperity)’을 발표했다. 경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8개월 간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웠다.5)
트럼프가 결국 대화를 거절당하는 모양새를 무릅쓰고 김정은과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구촌 냉전 지역에 대한 평화구상(peace initiative)을 추진한 지도자로 각인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가 작용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여전히 자신의 손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다는 의도다.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 최대의 장기로 생각하는 독재자와의 담판을 통해 꽉 막힌 대화의 장애물을 일거에 걷어냈다는 승부사 기질의 발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극적인 장면을 원하는 트럼프가 1대 1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김정은을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무대로 끌어내려 했다는 해석이다. 의제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협상 결과물을 내놓을 필요도 없으니 부담 없는 ‘외교쇼’로 판단했을 법하다. 미국 폭스뉴스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려는 진지함보다는 외교적 모험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6)
그럼에도 이번 회동 불발의 주된 원인은 전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거부 탓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트럼프의 요구를 마다했을까?
첫째 원인은 트럼프와의 만남이나 그의 즉흥적 제안이 김정은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토 옵(photo opportunity)’ 제안만으로는 김정은을 불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와 대북 제재 현상 변경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면서 미국 주도의 제재에 우회로를 찾은 북한은 이미 내성(耐性)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7)
둘째 원인은 6년 전과 사뭇 달라진 북한의 몸값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당시와 비교해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8) 특히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함께 이른바 핵 3국 연대를 공고히 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구(舊)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equidistance diplomacy)를 펼쳐왔다. 하지만 3국 협력이 공고화 된 현 상황은 양국 모두로부터 최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9)
6·25 전쟁 이후 가장 활발한 북-중-러 관계의 양상이나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세를 고려하면 굳이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꾀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외교사령탑인 최선희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보낸 것은 김정은의 대외 전략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줬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지난해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양국 관계는 혈맹의 관계로 나아갈 태세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해 트럼프와 ‘세기의 담판’을 펼치는 상황에서 ‘신 스틸러’의 악역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을 때 국내외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 대통령은 8월 25일 첫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을 제안하며 “피스메이커로 나선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돕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된 정동영 장관과 김대중 정부의 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세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미 회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급작스러운 만남을 걱정했던 시각은 대체로 트럼프가 말했던 ‘뉴클리어 파워’ 인정과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향후 협상의 틀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또는 동결에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중단 등을 북한에 내준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10)
공교롭게도 2025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터라 논란은 더 커졌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열렸던 김정은-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짐없이 들어갔다. 11)
결과적으로 ‘판문점 딜 2025’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후퇴도 일단은 기우(杞憂)에 그쳤다.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12) 당시 공동성명 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책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라고 선언했다. 한미 양국 모두 대북 압박보다는 관여(engage)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방향성에서는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예정을 밝혔지만, 미-북 4차 정상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의 깜짝 회동 제안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 단순한 일정 충돌이 아니라 향후 북핵 협상에 임하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근본적 인식 차이에 따른 것이라면 대화 재개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 직전 러시아-중국을 겨냥해 핵무기 시험 개시를 지시했고,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을 실제적 위협(credible threat)이라고 규정한 것도 악재가 될 수 있다.13)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개인적 친밀성에 기대 한반도 평화 및 남북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려는 구상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뤄진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1차)은 2019년 하노이 노딜(2차)의 여파로 실효성을 상실했고, 대화의 불씨를 만들어 보려던 판문점 3차 회동 이후 북-미 관계는 오히려 퇴행의 길을 걸었던 기억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류협력(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평화·공존·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14)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 조율이다. 예측 불가능한 성격에 더해 두 번째 임기를 맞아 ‘레거시’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될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국익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의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북한이 호응할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유효한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초당적 대북정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이다. 한반도 비핵화 비전 재확인과 남북상호간 확고한 군사합의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복원이라면 현 정부에 비판적 보수 진영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책추진의 정당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 평화구상 추진에 있어 중요한 덕목은 신속성과 과단성이 아니라 치밀함과 신중함이다.
| 새롭게 짜여진 판
| 익숙했던 구도, 판이했던 결과
| 트럼프의 의도, 김정은의 전략
| 이재명 정부에 던져진 과제
1)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핵 보유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고려할 때는 ‘핵무기를 생산한 나라’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0월 25일 제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 무기는 많지만 통신 서비스는 많지 않다”는 말을 농담조로 던졌다.
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한 김정은 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년 9월 22일.
3) Erika L. Green, Katie Rogers, “Will Trump Meet Kim Jong-un Again? He’s Very Open to the Idea,” The New York Times, October 28, 2025.
4) Kim Eun-joong, “Trump Wants to Meet Kim Jong-un Despite Missile Test,” The Chosun Ilbo, October 29, 2025.
5) Erika L. Green, Katie Rogers, Choe Sang-Hun, “Feted as a Peacemaker in South Korea, Trump Finds Purpose for Overtures to Kim Jong-un,” The New York Times, October 29, 2025.
6) Morgan Phillips, “Trump dangles ‘big as you get’ carrot in bid to tempt Kim and jump-start new North Korea talks,” Fox News, October 28, 2025.
7)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한 김정은 동지의 연설,” 『노동신문』, 2025년 9월 22일.
8) 미국과학자연맹(FAS),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현재 5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 이성윤,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세종정책브리프, No. 2025-26, 2025년 10월 15일.
10) Editorial Board, “As Trump seeks another meeting with Kim Jong Un, it’s not 2019 anymore,”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8, 2025; “The Deadly allure of a bad deal with North Korea,” The Economist, September 25, 2025.
11) 이성윤,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세종정책브리프, No. 2025-26, 2025년 10월 15일.
12)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5년 10월 29일
13) Senate Armed Service Committee Hearing on the Nomination of Vice Admiral Richard A. Correll, USN, “Advance Policy Questions,” October 30, 2025.
14) 임형섭, “이 대통령 ‘국방 외부의존은 자존심 문제…남북대화 대승적 노력’,” 『연합뉴스』, 2025년 11월 4일.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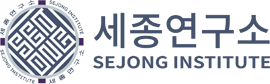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