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국제정치의 주요 안보 현안으로 자리해 있다.

|
대북한 관여 정책, 스웨덴 모델이 주는 시사점 |
| 2025년 11월 4일 |
-
이정규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jklee87@mofa.or.kr
-
한반도 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국제정치의 주요 안보 현안으로 자리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반복되는 도발은 동북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제 핵비확산 체제(NPT)의 지속 가능성에도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으나,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를 반복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스웨덴과 같은 중립적 중견국의 대북 관여 모델이다. 스웨덴은 1973년 북한과 수교한 이래, 서방 국가 중 드물게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운영하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익대표국(protecting power)’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과 서방 세계를 잇는 사실상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1)
본 논문은 스웨덴의 대북 관여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과 한국 외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한다. 특히 ① 스웨덴의 중립 외교 전통, ② 이익대표국 및 중재자(또는 중개자)로서의 기능, ③ 인도주의적 지원 및 개발 협력, ④ 장기적 신뢰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글은 궁극적으로 중견국 외교의 전략적 함의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관여 전략의 개념
국제정치학에서 ‘관여(engagement)’란 상대국을 국제 규범과 제도에 점진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전략을 의미한다.2) 억제(deterrence)나 봉쇄(containment)가 강압적 성격을 갖는 반면, 관여는 협력과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접근이다.3)
중견국 외교론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대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재자(mediator) 또는 중개자(intermediary)’ ‘규범 창출자(norm entrepreneur)’ ‘신뢰 구축자(trust-builder)’로서 국제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4)
스웨덴의 대북 정책은 이러한 중견국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제한적 역할’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다층적 해결 구조 속에서 보완적·촉진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중립 외교 전통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동맹 중립국’으로서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평화외교를 적극 전개해왔다.5) 1815년 비인평화회의 이후 약 200년 이상 이어진 스웨덴의 비동맹 중립정책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영세 중립국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외교안보 정책으로서의 중립이다. 스웨덴의 중립 외교안보정책은 ‘전시 중립을 위한 평시 비동맹(freedom from alliances in peacetime aiming at neutrality in the event of war)’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전시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평시에 군사 비동맹 노선을 견지할 필요성에 그 정책이 연원한다.6) 스웨덴의 이러한 중립적 외교안보 전통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북한이 비교적 수용 가능한 서방 채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스웨덴으로서는 중립국으로서 동서 양 진영의 국가 모두와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추구할 수 있었고, 북한은 포용적인 스웨덴의 외교정책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웨덴 같은 혼합경제(mixed economy)체제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스웨덴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웨덴의 잠재적 안보 위협이 현실화하는 순간이었고, 스웨덴은 안전보장을 보다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군사동맹인 NATO에 가입하므로써 오랜 중립 외교안보 정책을 포기하였다.
이익대표국 역할
스웨덴은 평양 주재 미국 대사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 7) 를 평양에 두고 있다. 8) 이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을 넘어, 위기 시 북·미 간 비공식 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9) 당초 스웨덴은 1994년 평양 주재 대사관의 철수를 고려하였으나,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북한과 더 원활한 소통이 필요했고, 북한을 방문하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스웨덴에 이익대표국 역할을 요청하여 스웨덴이 이를 수락하고 자국 대사관 철수 결정을 철회하였다. 북한은 2018년 5월 억류되었던 미국인 3명 10) 을 석방하였다.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은 미국의 이익 대표부로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그 결과로서 미국인들의 석방을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미국 국민의 북한으로부터의 석방에 관해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스웨덴의 헌신적인 수고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요나스 웬델(Jonas Wendel) 주북한 스웨덴 대사와 대사관 팀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부 장관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에서 억류자 석방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스웨덴이 평양 주재 대사관과 스톡홀름 주재 북한대사관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의 2018년 3월 스톡홀름 방문 시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협의하였다고 석방 교섭 과정을 소개하였다.
인도주의 지원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1990년대 북한의 혹독한 기근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해왔다.11) 이는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된 협력 분야로서, 긴장 국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엔 인도국(UNDHA),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여러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구호단체의 평양 상주도 허용하였다.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민간 구호단체를 참여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약 130개 구호단체가 북한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그중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비중이 가장 컸다. 스웨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2020년까지 매년 중단 없이 약 400-500만 불 정도의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였다. 스웨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국가 단위 규모 1위를 할 만큼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인도적 지원은 공여국 정부의 개발 과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개발 원조와 달리 인도적 수요가 있을 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인류애’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스웨덴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 핵실험 같은 정치적 상황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나라였다. 12) 유럽연합 인도지원청(ECHO)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를 보면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 지원액이 급감하였고, 그 후 2011년 정점까지 점차 증가하였다가 2012년 다시 급감하여 거의 중단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반면, 스웨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무력 강화 때마다 약간 감소하는 등 다소 등락을 보이긴 하였지만, 평균적으로 약 400-500만 불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스웨덴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북 제재의 면제 사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국 면제를 받아냈다. 13)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스웨덴이 인도적 소요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지원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대북한 관여는 인도적 지원, 교역, 전략대화, 인권, 비핵화 등 국가별로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스웨덴의 대북 관여는 인도적 지원과 역량강화사업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인 역량강화사업은 다른 유럽국들의 대북한 관여와 스웨덴의 대북한 관여를 구분 짓는 스웨덴만의 강점이었다. 스웨덴의 역량강화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 및 경제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낼 때를 대비하여 북한 관료와 학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스웨덴이 대북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0년대 말 북한이 스웨덴에 시장경제 교육을 요청하였고, 2001년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웨덴 모델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를 요청하면서 계기가 마련되었다.
스웨덴의 대북한 역량강화사업은 주로 스톡홀름 경제대학 같은 대학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안보개발연구소(ISDP) 같은 정책연구소 등 비정부 연구기관을 통해 시행되었다.
조용한 중재(또는 중개) 외교
스웨덴은 공개적이기보다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를 선호한다. 2018년 5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한 달 전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민 3명이 석방되도록 북한 당국과 교섭하였고,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한 달 전 미국의 대북정책대표로 새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이 북한의 협상 대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첫 대면 할 수 있도록 스톡홀름 외곽 하크홀름순트에서 남북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주선한 바 있다. 14) 또한, 2019년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 불만을 품고 미국과 일체 대화를 중단한 상황에서 스톡홀름에서 고위 실무급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등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외교를 조용하게 진행하였다. 15)
스웨덴은 왜 국제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는가? 스웨덴은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중립을 통한 안전 보장의 정책이 잘 유지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어 불안정 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은 스웨덴이 원하는 바인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스웨덴은 정치적으로는 외교력을 발휘하여 국제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경제적으로는 능동적인 대외원조를 통해 가난한 국가의 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스웨덴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시행해 온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웨덴은 2017년 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의장을 맡게 되었고 이를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였다. 스웨덴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발스트룀 외교부 장관은 2017년 봄 북한 상황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켄트 해쉬테트(Kent Härstedt) 사회민주당 의원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해쉬테트 의원은 발스트룀 장관에게 지금이 북한 문제에 스웨덴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해쉬테트 의원은 수년간 북한을 접촉해 왔고 1996년 이래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온 인사로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였다. 16) 해쉬테트 의원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으로 만찬에 초대하면 모두 이에 응할 정도로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이런 고위급 인사들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 방문하는 경우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관계라고 평가된다.17)
스웨덴 정부는 2017년 켄트 해쉬테트 의원을 한반도 담당 정부 특사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대북 평화 중개외교에 착수하였다. 18) 특사의 임무는 대화를 촉진(facilitating talks)하고 신뢰를 조성(building trust)하는 것이었다.
‘중재자’와 ‘중개자’는 분쟁의 당사자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중재자가 분쟁의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해 중개자의 주된 목적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메시지 전달이나 회담 장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는 차이가 있다. 19) 즉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대북 평화 중개외교에 있어서 항상 자신들은 조력자의 역할에 임무를 한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반도 주변 4국 같은 협상의 중재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인식한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발스트룀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면 줄수록 결국 우리는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역할에 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라고 말했다.20) 발스트룀 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은 대화 촉진 및 대화 분위기 조성, 대화 장소 제공 등 조력자의 역할로 자신의 임무를 한정하였다. 즉 중재자가 아닌 중개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스웨덴의 NATO 가입 결정은 기존의 중립정책 기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지정학적 전환 속에서 스웨덴의 대북한 관여정책은 과거와 달리 안보 연대와 대북 제재 이행의 일환으로 조정되고 있다.
최근 스웨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동참하면서도 21) , 동시에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는 ‘이중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외교부는 유엔 제재 틀 내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비정치적 인도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비통제와 비핵화 문제를 연구·논의하는 국제적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NATO 가입으로 기존 중립 정책을 더는 같은 강도로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지만 대북한 관여에 있어서는 계속 의지는 감추지 않고 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2023년 분쟁 해결 전문 외교관 출신 페테르 셈네비(Peter Semneby) 대사를 한반도 담당 정부 특사로 임명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셈네비 특사는 2025년 한국을 방문하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한 바 있다. 22) 스웨덴은 현재 한반도 담당 특사를 통한 북한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건이 성숙될 때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준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웨덴의 대북한 관여는 ‘중립적 중재자’에서 ‘규범적 참여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립을 표방하던 기존의 균형 외교 대신 NATO와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스웨덴의 대북 접근은 안보적 현실주의와 인도주의적 이상주의가 병존하는 복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제3국 중재 채널의 필요성
스웨덴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 중립적 완충지대(buffer)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미·중·일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 유용하다. 23)
인도주의적 접근의 제도화
한국 역시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된 인도주의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처럼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한다면, 제재 국면에서도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
다자 외교와의 연계
스웨덴 모델은 단독 접근이 아니라 EU, UN과 같은 다자 틀과 결합되어 효과를 발휘했다. 24)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만 한정하지 말고 향후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대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 외교의 강화
스웨덴은 작은 국가임에도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했다. 이는 한국이 중견국 네트워크(미들 파워 연대)를 활용하여 북한 문제를 다자적·협력적 틀에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25) - 스웨덴 모델은 유용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북한의 외국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인해 스웨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둘째,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합의에 좌우된다. 따라서 스웨덴 모델은 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해야 하며, 한국 외교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역할로 인식해야 한다.
-
스웨덴의 대북한 관여 모델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립적 신뢰 채널, 인도주의의 지속성, 중견국 외교의 잠재력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은 이러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중심의 구도에 더해 다자적·중견국 차원의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스웨덴의 평화 중개외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인도적 지원, 북한의 학자와 관료 등 중간 계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제재 속에서도 이어 온 고위급 접촉 및 대화 채널 유지라는 규범적 관여를 통한 북한의 신뢰 확보다. 스웨덴은 북한의 신뢰를 먼저 확보한 후 이에 기초하여 북한과 서방의 중간에서 효과적인 중개 외교를 할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기적 정치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신뢰 구축 과정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직접 당사자는 물론 남북한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스웨덴 같은 중립적 대북 관여 경험이 있는 제3자를 ‘선량한 중개자(Honest Broker)’로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하다. 스웨덴 모델은 그 자체로 완결적 해법은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보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 서론
1) Karin Jönsson, Swede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 History of Engagement, Stockholm: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9, p. 15.
| 이론적 배경: 중견국 외교와 관여(Engagement) 전략
2)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Ross (ed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Routledge, 1999.
3) 전재성,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1호, 2003.
4)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and Kim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UBC Press, 1993.
| 스웨덴의 대북 관여 모델
5) Gunnar Åselius, “Sweden’s Security Policy in the Cold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2, No. 1 (1995), pp. 9-21.
6) 이정규, ‘스웨덴의 대북한 관여 정책 연구 : 규범적 관여 외교에서 평화 중개외교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7) 이익대표국(또는 이익 대표부) 제도는 1870〜1871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1929년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The Geneva Convention 1929)에서 공식화하였다. 이익 대표부 설치 사례: 조지아와 러시아 양국에 설치된 스위스 대사관, 주이란 스위스 대사관(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이익 대표부), 주이란 이탈리아 대사관(캐나다 이익 대표부), 주오만 캐나다 대사관(이란 이익 대표부), 주미국 파키스탄 대사관(이란 이익 대표부), 주아프가니스탄 카타르 대사관(미국 이익 대표부), 주시리아 체크대사관(미국 이익 대표부),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미국, 캐나다, 호주 이익 대표부)(출처 : 위키피디아)
8)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Sweden, Sweden in North Korea: Protecting Power Mandates, Stockholm, 2020.
9)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미국의 이익 대표부(interests section) 역할을 한다. 이익 대표부는 이익대표국(protecting power)의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 공관을 의미하는데, 이익대표국의 사전적 의미는 무력 분쟁이나 전쟁 또는 외교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일방의 당사국 의뢰로 그 당사국이나 국민의 이익을 타방 당사국 영역(또는 점령 지역) 내에서 보호할 임무를 위탁받은 제3국을 의미한다. 즉,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고 평양에 상주 외교 공관도 없는 미국의 이익을 북한에서 보호하고 미국 국민의 영사 문제 등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스웨덴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10) 김동철, 토니 김, 김학송 3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북한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었거나 연구 농장에서 노역하고 있었다. 스웨덴 대사관은 캐나다와 호주의 이익 대표부 역할도 맡고 있는데, 2017년 8월 한국계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 석방과 2019년 6월 호주의 유학생 알렉 시글리 석방에도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1)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Annual Report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2021.
12) 고상두, 『유럽 중립국의 대북정책 특징과 시사점: 스위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용역보고서, 2021; European Commission, EDRIS database; http://webgate.ec.europa.4u/hac.
13) “IFRC “유엔, 인도 지원 대북 제재 예외 분위기 탄력”,” 『연합뉴스』, 2018년 11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014500504?input=1195m(검색일 : 2022.8.9.)
14) 이 회의는 외형상으로는 스웨덴 평화군축연구소(SIPRI)가 주최기관으로 나섰고, 실제로는 스웨덴 외교부가 주관하였다.
15) Anna Wieslander, “Sweden’s Role in the North Korea Talk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2019.
16) 켄트 해쉬테트 의원은 1998년〜2018년 동안 사회민주당 5선 의원(지역구는 스웨덴 서남부 도시 헬싱보리(Helsingborg))을 역임하였고, 2014년〜2017년 동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회 협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이 기간에 우크라이나 의회 선거 OSCE 선거감시단 특별 조정관,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OSCE 특별 조정관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17) “Sweden’s and Wallstrom’s unknown role in the game about North Korea”, Dagens Nyheter, 2018년 5월 31일, https://www.dn.se/nyheter/politik/sveriges-okanda-roll-i-spelet-om-nordkorea/
18) 스웨덴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제한된 역할을 고려하여 켄트 해쉬테트 의원의 한반도 담당 특사 임명을 대외적으로는 가능한 조용하게(low-key) 유지하였다.
19) Bjereld, Ulf, “Critic or Mediator? Sweden in World Politics, 1945〜90”, 『Journal of Peace Research』, Feb. 1995, Vol.32, No. 1, pp. 23〜35
20) Dagens Nyheter, May, 31, 2018, op. cit.
21) 스웨덴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의 불법 침공과 마찬가지로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대북정책 기조로 삼았다. 또한 NATO의 2023 전략개념보고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실질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22) 2025.9.15.자 통일부 보도자료 참조.
| 한반도 안보 및 한국 외교에 주는 시사점
23)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210-212.
24) Andrei Lankov,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Vol. 41, No. 2 (2017), pp. 189-210.
25) Björn Jerdén, “Small States and Mediation Diplomacy: The Case of Sweden,” Europea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7, No. 1 (2020), pp. 55-74.
| 한계와 고려사항
| 결론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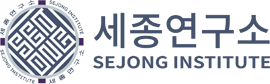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