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질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였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안보 지형에 미친 영향 분석 |
| 2025년 11월 4일 |
-
이정규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jklee87@mofa.or.kr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질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제법의 근간과 유럽의 협력적 안보 패러다임을 심각하게 흔들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유럽은 “전쟁 없는 대륙”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며, 경제적 상호의존과 제도적 협력으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이러한 낙관적 기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러시아는 현재 “소모전”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전선에서 점진적 영토 확대를 계속 노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주요 보급로 방어, 도시 및 인프라 보호, 서방의 군사⋅재정 지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일부 반격 및 소규모 전선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역 반환과 국가 주권 및 안전보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상당한 영토를 점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하려는 입장이 강하여 양측간 조건의 큰 간극이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안보 지형에 미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NATO의 위상 강화, EU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에너지 안보 변화, 그리고 유럽 안보의 다극화 경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향후 유럽 안보의 전망과 한반도 등 비유럽 지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유럽 안보 구조의 배경
냉전 시기 유럽 안보 구조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립을 축으로 형성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는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상호 억제를 유지하였다. 특히 핵무기는 유럽 안보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상호확증파괴(MAD)”라는 안정적 공포 균형이 유지되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유럽은 협력적 안보를 추구했다.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NATO–러시아 평의회, EU 확대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독일 통일과 EU 확대는 탈냉전기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적 안보 구상은 러시아의 점증하는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2008년 조지아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은 러시아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신호탄이었다. 서방은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했지만, 군사적 대응은 미약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 안보 구조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과정
러시아의 전쟁 동기는 다층적이다. 첫째, 나토(NATO) 동진 확대에 대한 안보적 불안감, 둘째,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행보 차단, 셋째, 제국적 영향권 회복 욕구가 결합되었다.
먼저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로 인해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1999년 폴란드·헝가리·체코의 나토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까지 나토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의 국경과 나토의 군사력이 직접 맞닿는 상황이 현실화되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군사동맹의 지속적인 동진이 전통적인 안보 완충지대를 잠식하는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2008년 부쿠레슈트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레드라인’으로 규정하였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서방 세력(나폴레옹, 히틀러 등)의 침공을 겪었기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 본토 사이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유지하는 것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여겨 왔으며, 우크라이나는 흑해로 향하는 통로이자 러시아 서부 국경과 직결되어 있어서 NATO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경우 러시아 심장부(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러시아가 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적 행보 차단이다. 1991년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는 친러와 친서방 성향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으나, 2014년 마이단 혁명(유로마이단 사태)으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이 축출되고,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및 나토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러시아는 이를 ‘서방의 지정학적 확장’으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같은 해 크림반도를 병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서방 편입을 견제하려 했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훈련에 참여하고,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며 서방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자, 러시아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억제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결국 2022년 전면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일체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러시아의 제국적 영향권 회복이다. 푸틴 정권은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大러시아(Russian World)’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구소련 권역을 자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역사·문화·언어적 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명적 공간(civilizational space)’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푸틴은 여러 차례 연설에서 “소련 해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가 국제 체제에서 ‘강대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정신적 차원에서 ‘키이우 루스’의 계승국으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국적 영향권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단순히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질서 속에서 ‘옛 소련 영역에 대한 지배력 복원’을 목표로 한 정치·이데올로기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 동진이라는 구조적 요인,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라는 촉발 요인, 러시아의 제국적 영향권 회복이라는 이념·전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은 1단계(2022.2~4)로 러시아의 전면 침공과 키이우 점령 시도 실패 후 동부·남부 전선 집중 시기를 거쳐, 2단계(2022.5~2022.12)인 돈바스 지역 전투 격화, 하르키우·헤르손 반격, 3단계(2023~현재) 교착 국면과 장기전 양상 및 서방의 무기 지원 본격화라는 3가지 단계로 그 과정을 구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은 크게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 개입과, 중국·인도 및 다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중립적 태도로 양분할 수 있다.
첫째,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 군사적 지원, 정보 협력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러시아에 대해 대규모 금융 및 무역 제재를 단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 결제망인 SWIFT에서 배제하였으며,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하고, 1)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수출을 차단하였다 2) . 또한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축소하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3) 군사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HIMARS 다연장 로켓, 패트리엇 방공체계, M1 에이브럼스 전차, 장거리 미사일(ATACMS)과 F-16 전투기 훈련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독일·폴란드·영국 등은 레오파르트 전차와 대공 방어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였다. 4) 동시에 서방은 첩보 자산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이동 및 타격 목표에 관한 위성·신호정보(SIGINT)를 공유하고, 사이버 방어 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장을 뒷받침하였다. 5)
둘째,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2022년 전쟁 발발 직전 시진핑과 푸틴은 양국 관계를 ‘무제한 협력(no limits partnership)’으로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침략’으로 규정하지 않고 ‘합법적 안보 우려’라는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6) 다만 서방의 제재를 직접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을 크게 늘려 경제적 완충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2023년에는 12개 항의 평화 중재안을 발표하며 국제무대에서 ‘중재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였으나, 서방은 이를 실질적 중재라기보다는 친러시아적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였다.7)
셋째,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였다. 인도는 냉전 시기부터 유지해온 비동맹 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전통적 군사·에너지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쿼드(Quad)에 참여하는 균형 전략을 구사하였다. 8) 전쟁 발발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저가에 대량 수입하였고, 이를 정제하여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국제무대에서는 유엔 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다.9)
넷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다수 국가는 중립 또는 실리적 태도를 취하였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은 러시아와의 경제·에너지 협력 관계 및 식량·비료 의존도를 고려하여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10) 또한 일부 국가는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과 반서방 정서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기보다, 미국과 유럽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태도를 보였다.11) 중동 국가들은 이라크 전쟁 사례와 비교하며 서방의 도덕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와 비료를 확보하는 한편, 서방과의 무역·투자 관계도 유지하려는 실리적 외교를 전개하였다.
종합하면, 국제사회의 대응은 서방의 적극적 개입과 비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중립이라는 구도로 분화되었다. 서방은 ‘규범과 안보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반면, 중국·인도 및 글로벌 사우스는 자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중립적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전쟁이 ‘세계적 차원의 가치 충돌’이 아니라 ‘강대국 간 갈등’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NATO 존재 이유의 재확인
냉전 종식 이후 NATO는 그 존재 의의가 점차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990년대에는 발칸 지역 분쟁 개입이나 대테러 활동 등을 통해 역할을 찾으려 했지만, 집단방위 동맹으로서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희석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집단안보 체제의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켰으며, NATO가 여전히 유럽 안보의 핵심 기제로 기능함을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NATO는 단순히 냉전기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필수적인 다자 안보 체제임을 재확인하였다.12)
중립국의 전략적 전환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유럽 안보 질서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로 꼽힌다. 두 국가는 약 200년 동안 중립 정책을 유지하며, 군사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독자적인 안보 노선을 걸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은 중립국으로서의 안전보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양국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2023년 핀란드, 2024년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함으로써 북유럽 전체가 NATO 방위망 안에 편입되었다. 발트해가 나토의 호수가 된 것이다. 이는 유럽 북부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NATO의 확대가 러시아를 정치적·전략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13) -
억제력 강화
NATO는 러시아의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억제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동부 전선(폴란드, 발트 3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기존 신속대응군(NRF: NATO Response Force)의 규모를 약 4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명확한 억제 신호로서, NATO의 집단방위 공약(Article 5)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14) 또한 이러한 조치는 유럽 각국의 국방비 증액 움직임과 맞물려 NATO의 집단적 군사 역량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에너지 안보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쟁 이전까지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상당한 비중을 의존하고 있었으며, 2021년 기준 약 40% 이상의 가스 수입이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졌다. 15) 그러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은 EU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공급선을 찾아 수입선을 다변화하도록 강하게 자극하였다.
EU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과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 수입선을 확보하려 했다. 동시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하며 에너지 전환을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와 직결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방위산업 공동 투자
안보 환경 악화는 유럽 방위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EU는 2017년 출범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EDF)을 중심으로 무기 공동개발과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16) 이는 회원국 간 중복투자를 줄이고, 독자적인 군사기술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사력 차원에서는 NATO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특히 첨단 지휘통제 체계, 전략수송, 핵 억지력 등 핵심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7)
전략적 자율성 논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은 EU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어 왔다.18) 그러나 회원국 간 이해 차이가 크고,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해 있어 NATO의 집단방위 체제에 강하게 의존한다. 따라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EU의 장기 비전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점에서 EU의 안보 전략은 “자율성”과 “동맹 의존”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국제적 고립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고립을 경험하였다. G7,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서방 국가 및 기구들은 러시아와의 정치·경제·군사적 협력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였다. 특히 국제금융결제망인 SWIFT에서의 배제는 러시아의 국제 금융 거래를 심각하게 제한하였으며, 이는 외환 유출 차단과 투자 위축을 초래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철수는 러시아 내 소비재 공급망과 산업 전반에 심대한 공백을 남겼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무기화의 실패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대외정책의 핵심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및 원유 공급 축소를 통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신속히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노르웨이·미국·카타르 등 대체 공급원 확보,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단기간 내에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술핵 위협
에너지 지렛대가 약화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군사적 위협 수단, 특히 전술핵의 배치를 강조하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놓았고, 이는 유럽 내 안보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핵 위협은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지니지만, 동시에 NATO의 억지 태세 강화를 불러오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러시아의 전술핵 수사는 단기적 위협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의 리더십 강화는 성공적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군사·경제적 차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적 리더십을 재확립하였다. 군사적으로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첨단 무인기 등 전쟁 수행 핵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으며, 이는 전장의 균형을 일정 부분 바꾸는 데 기여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에너지·인프라 복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불가결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미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제기되었던 ‘유럽의 자율적 안보 구상’ 담론19) 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북대서양동맹(NATO)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가 재확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미국 내 여론⋅재정 부담 상승 등으로 인한 ‘지원 피로감’이 커졌고, 인도⋅브라질⋅아프리카⋅중동 일부 국가 등 ‘글로벌 사우스’의 대러 제재 불참 및 서방 프레임에 대한 미온적 반응,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 초래 등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미국의 서방 동맹권 내 리더십 강화에는 분명 성공 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압도적 리더십을 회복했다기보다는 ‘부분적⋅지역적 성공’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최종 목표 완전 달성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는 앞으로의 자원 배분⋅정책 지속성⋅동맹 공조 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자이트엔벤데(Zeitenwende, 시대적 전환)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독일 안보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발하였다. 2022년 2월 숄츠(Olaf Scholz) 총리는 ‘자이트엔벤데(Zeitenwende, 시대적 전환)’ 20) 를 선언하며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 조성 및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독일은 미국의 F-35 전투기 구매를 결정하여 NATO의 핵 공유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전후 독일이 유지해 온 ‘경제 우선-군사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군사력을 국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다시 위치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변화는 단순한 국방비 증액에 그치지 않고, 유럽 안보의 균형과 NATO 내 전략적 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장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국방비를 GDP 대비 4%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제 에이브럼스 전차, HIMARS,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였다. 또한 병력을 30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며 동유럽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발트 3국 또한 국방비를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NATO 병력 순환 주둔을 적극 수용하면서 방공 및 포병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거나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경험한 바 있어, 군사력 증강은 단순한 방위 능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결속 강화와 동시에 유럽 내부의 전략적 지형 변화를 동반한다.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유럽 내 자율안보 논의를 후퇴시켰으며, 독일의 자이트엔벤데는 NATO 내 군사적 균형을 재편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더불어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장은 유럽 안보 구도를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시키며, NATO 집단방위 체제를 더욱 전면화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안보 구조가 다시금 미국 중심의 틀로 회귀하는 동시에, 독일·폴란드 등 새로운 군사 강국의 부상을 예고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NATO–EU 관계 조정
향후 유럽 안보 질서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NATO와 EU의 역할 분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전통적 군사동맹인 NATO의 안보적 기능을 부각시켰으며, 미국의 주도 아래 NATO는 유럽 방위의 핵심 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 위기와 경제 제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은 NATO가 아닌 EU의 제도적 역량을 요구하였다. EU는 공동 제재 체제, 에너지 안보 대책, 난민 수용 및 복구 지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NATO의 군사적 억제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럽 안보 구조는 군사적 차원의 NATO, 비군사적 차원의 EU라는 이원적 체제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업적 구조는 안보 개념을 군사 영역에서 경제·사회·에너지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경제 안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시도는 유럽이 에너지 다변화 전략을 가속화하도록 만들었다. 노르웨이, 미국, 카타르로부터의 LNG 수입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EU 차원의 노력은 단순히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이는 유럽 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제고하고, 러시아와의 구조적 의존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동·북아프리카 산유국과의 관계 심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에너지 안보는 산업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과도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유럽이 글로벌 경제·환경 규범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는 단기적 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유럽 전략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 장기적 대치와 대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단기적 관계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구조적 대립을 고착시켰으며, 이는 장기간의 대치 국면을 예고한다. 그러나 냉전기의 경험이 보여주듯, 군비 통제 및 위기관리 대화 채널은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에 필수적이다. 향후 유럽 안보 환경에서 핵심 과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핵전력 사용 위험, 전술핵 배치 문제, 국지적 군사 충돌을 관리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 전망에서 유럽 안보는 억제와 대화의 병행 전략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유럽 전체 안보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촉발하였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NATO는 동유럽 국가의 안보 강화와 동진 확대(Enlargement)를 추진해 왔으나,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는 회원국들의 방위력 강화와 집단방위 의무(Article 5) 실행의 필요성을 한층 명확히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NATO는 동부 회원국 주둔 병력 증강, 연합군 훈련 확대, 신속 대응군 강화 등 실질적 군사력 강화에 나섰으며, 전략적 개입과 억제 능력 측면에서 더 능동적·공세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NATO의 조직적 통합성과 유럽 안보 질서 내 중심적 지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U는 경제적·정치적 통합을 통해 안보를 보완하려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전쟁 초기 미국 주도의 군사·안보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체감하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국방 산업 투자 확대, 전략물자 비축 및 인프라 보호 등 다층적 안보 정책을 강화했다. 이는 EU가 군사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EU 단독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NATO와의 협력과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드러났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 고립을 겪고 있으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적 억제력(strategic deterrence)을 유지함으로써 유럽 내 불안정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핵 억제력은 NATO 회원국과 EU 국가들의 안보 정책 결정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며,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강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강화라는 연쇄적 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유럽 안보 질서는 단순히 군사적 균형 문제를 넘어, 에너지·경제·외교적 다층 전략과 결합된 복합적 안정성(complex stability) 확보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유럽 안보 질서는 세 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NATO와 EU 간 역할 조정은 군사력과 경제·외교력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NATO는 집단방위와 전략적 억제를 담당하고, EU는 에너지, 경제, 사이버·정보 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전략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분업적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에너지 및 경제 회복력 강화는 외부 충격, 특히 러시아와 같은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경제적 취약 부문 보호, 금융·산업 인프라 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의 장기적 대치 관리는 단순한 군사적 억제에서 벗어나, 외교적·경제적·정보적 차원의 다층적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기적 안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균형 전략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럽 안보 질서의 변화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력 측면에서 유럽의 다층적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자국 방위력을 보완하는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럽에서 나타난 NATO–EU 상호 보완 모델은 한미일 또는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 구조 설계에도 참고될 수 있으며,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통합적 전략 구상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유럽 안보 구조 재편과 동북아 전략적 시사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서론
| 유럽 안보 구조의 배경과 우크라이나 전쟁
1) 러시아 중앙은행은 전쟁 전 약 6,4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산은 미국·유럽 금융기관에도 분산 예치되어 있었고, 서방 국가들은 자국에 예치된 러시아의 외화⋅국채⋅금융자산을 묶어 두어 러시아가 이를 현금화하거나 국제 금융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2) Daniel Gros, The Western Sanctions on Russia: Effectiveness and Economic Impact, CEPS Policy Brief, 2022.
3)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Plan, 2022.
4) Michael Kofman & Rob Lee, “Ukraine’s Counteroffensive and Western Military Aid,” War on the Rocks, 2023.
5) U.S.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on U.S.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2023.
6) Yun Sun, “China’s Strategic Ambiguity on the Ukraine War,” Brookings Institution, 2022.
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China’s Position on th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Ukraine Crisis, 2023.
8) Happymon Jacob, “India’s Balancing Act in the Russia-Ukraine War,” Carnegie India, 2022.
9) UN General Assembly, Voting Records on Ukraine-related Resolutions, 2022–2023.
10) Oliver Stuenkel, “The Global South and the Ukraine War,” Foreign Affairs, 2023.
11) Steven Erlanger, “Many Countries in Global South See West’s Double Standards in Ukraine War,” The New York Times, 2022.
| 나토의 재부상과 확장
12)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2022 Strategic Concept, Brussels: NATO Public Diplomacy Division, 2022, pp. 5–7.
13) Mikael Wigell, “Finland’s NATO Membership and the Future of Nordic Security,” Journal of Baltic Security, Vol. 9, No. 1 (2023), pp. 11–14.
14) NATO, “Madrid Summit Declaration,” June 29, 2022, available at: https://www.nato.int.
|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한계
15) Eurostat, EU Energy Statistical Yearbook 2022,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2, pp. 45–48.
16)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Defence Fund,” Official Website, 2023,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
17) Jolyon Howorth, “Strategic Autonomy and EU–NATO Relations: The Enduring Dilemma,” Journal of European Security Studies, Vol. 28, No. 2 (2022), pp. 221–224.
18) Thierry Tardy, “European Strategic Autonomy: What It Is, Why We Need It, How to Achieve It,”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Brief, No. 12 (2019), pp. 1–4.
| 러시아의 고립과 역전된 에너지 무기화
| 유럽 안보의 다극화 경향
19) 유럽의 ‘자율적 안보 구상(strategic autonomy)’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NATO를 구식이라고 표현하고, 유럽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데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이 ‘유럽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공개 발언하고 EU 정책 문서에 정식으로 등장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는 다시 미국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나, EU의 공동 군사 프로젝트인 PESCO(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유럽방위기금(EDF), 유럽신속배치능력(EU Rapid Deployment Capability, 2025년까지 완비 목표) 등 제도는 계속 추진 중이다. 따라서 유럽의 ‘자율적 안보 구상’은 현재 ‘단기적으로 미국 의존, 장기적으로 자율 안보 모색’이라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 2022년 2월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열린 독일 연방 의회 특별 연설에서 숄츠 총리는 “Wir erleben eine Zeitenwende.(우리는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이후 독일과 유럽 정치 담론에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핵심어로 자리 잡았다.
| 유럽 안보의 향후 전망
| 결론(유럽 안보 질서 전망과 동북아 안보 환경)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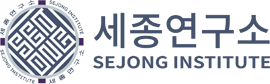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