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호주·미국·영국은 AUKUS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SSN) 협력을 선언했고, 2023년 구속력 있는 협정을 체결했다. 호주는 재래식 콜린스급을 대체하여 2030년대 중반까지 버지니아급 SSN 3~5척, 2040년대 이후 AUKUS급 SSN을 영국과 공동 건조하게 된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전력 확충을 넘어 호주의 해양전략과 정체성의 대전환을 상징한다.
거시 군사 전략 차원에서는 냉전기 본토 방어 중심에서 해군을 이용한 전진 방어 및 전력 투사형 전략으로 회귀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양전략 차원에서는 방어적 해상 거부(sea denial) 에서 공격적 해상 통제(sea control)와 거부 억제(deterrence by denial)로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전략 목표는 중국의 해양 접근 억제와 남중국해 보루 전략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다. 핵확산과 군비경쟁 위험, 비현실적 도입 및 건조 일정, 고비용, 주권 제약, 핵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비판들이 존재하지만, 2025년 기준 호주 국민 67%가 여전히 이 AUKUS 프로젝트를 찬성하고 있다.
2009년부터 노동당 집권 시기에 전략적 헤징(hedging) 개념이 도입되었다. 러드 정부는 다가오는 미래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전제하고 SEA 1000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공식화했다. 기존 잠수함 체제를 6척에서 12척 체제로 확대하고, 기뢰부설·순항미사일 등 공세적 기능이 추가되었다. 호주 본토 방어 중심이던 해상 거부 전략을 넘어 제한적 해상 통제 및 전략타격까지 지향하게 된 것이다. 국내 건조 원칙 속에 산업정책과 안보 전략을 연계했다. 2013년 길라드 노동당 정부는 인도-태평양 개념과 국제 관여 정책을 채택하고, 콜린스급 수명연장 및 개량형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 시기 호주 정부는 기술·비용·정치적 제약 등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옵션은 배제했다.
2014년 애벗 보수연합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행동을 비판하며 동맹 중심의 세력균형 정책을 구상했다. 새롭게 건조될 잠수함의 배수량을 5,000톤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무장과 작전 구획을 넓혔다. 그러나 기존 노동당 정부가 구상한 육지 공격형 순항미사일 계획은 포기했으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2016년 턴불 정부는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모델로 선정했다. 500~800억 호주달러를 투자해서 국내 건조율 90%와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보장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기 호주의 전략은 동맹 기반 세력균형과 해상 통제 능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8년 모리슨 보수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강압,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해 2020년 방위전략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인도양–태평양 근접 지역 방어와 원거리 타격·전력 투사 능력 확보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미·영과 핵추진 잠수함 협의를 개시했는데, 2021년 프랑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AUKUS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노동당 앨버니지 정부는 진보 세력의 전통적 반핵노선에도 불구하고 AUKUS 사업을 계승하고, 2023년 국방전략검토와 투자계획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구체화했다. 2027년부터 서부 퍼스(Perth)의 HMAS Stirling 기지에 미국과 영국의 SSN 순환 배치가 시작되고, 2030년대 미국 SSN 3–5척 인도, 2040년대 초 SSN-AUKUS 영·호 공동 건조 개시 등이 합의되었다. 호주 잠수함청이(ASA) 신설되었고, 원자력기술·핵연료 관리·인력 양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호주의 전략은 비핵 제한적 거부 억제(deterrence by denial) 단계로 진입했다.
AUKUS 사업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억제구조에서 호주의 역할이 확대되고, 미국, 영국과의 기술 및 지휘통제 협력이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통해 장기 잠항과 광역 작전이 가능해 질 것이고, 중국의 보루 전략에 대한 압박력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들도 존재하는데, 과도한 대미 의존과 기술 및 운용 비용 증가 등이 그 예이다. 핵확산 규범 및 주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호주의 미흡한 산업 인력 기반이 문제시 된다. 현실적인 억제력 구축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잠수함 공백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린다.
호주 사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호주의 사례는 위협 인식과 목표가 적절하더라도 수단의 현실성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UKUS는 중국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동맹 정치와 국내 산업의 제약 속에서 실현까지 많은 위험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 속에서 단일 수단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층적 수단과 기술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전력 구축을 추진하지만, 대북 억제에 단기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억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은 이론이 아니라 기술(art)이며, 정치·경제·군사·외교를 종합한 현실적 설계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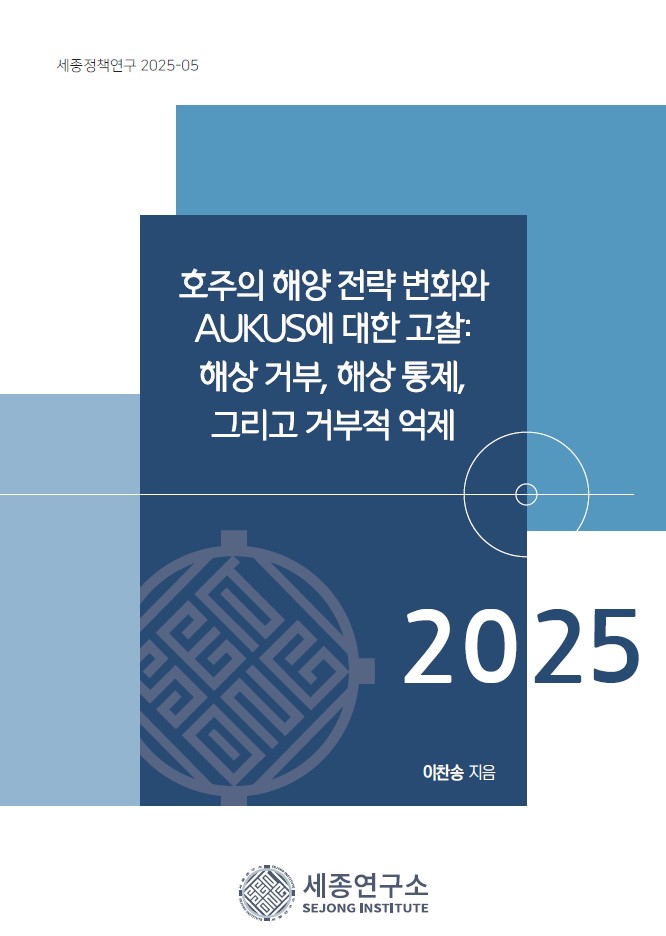
 파일명
파일명